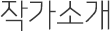금호미술관
정영호 / 2022년 20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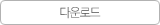
정영호
jeongcoma@gmail.com
2018 영국 왕립예술대학(Royal College of Art) 사진학과 석사 졸업
2014 중앙대학교 사진학과 학사 졸업
개인전
2023 《Double Retina》, 금호미술관, 서울
2022 《Converted and Interpolated》, 을지로 상업화랑, 서울
2021 《Out of Photography》, 송은아트큐브, 서울
그룹전
2023 《Infinite Interpretations: A Multiplicity of Truths》, 빙햄튼대학미술관, 빙햄튼, 미국
2022 《Perigee Winter Show 2022》, 페리지 갤러리, 서울
2022 《BGA INDEX: OPEN STORAGE》, BGA INDEX, 서울
2022 《Spaceless》, 주한 스위스 대사관, 서울
2022 《inter-face》, 페리지 갤러리, 서울
2022 《Summer Love 2022》, 송은, 서울
2022 《Where Are We Now》, 성곡미술관, 서울
2021 《Bit Sip : Resized》, whitenoise, 서울
2021 《MEET》, 문래예술공장, 서울
2021 《Visible Voices》, 라즈니아 현대예술센터, 라즈니아, 폴란드
2018 《Show 2018》, 영국 왕립예술대학, 런던, 영국
2018 《Night Visions》, 런던 박물관, 런던, 영국
2017 《Unexpected》, Hoxton Arches Gallery, 런던, 영국
2017 《SightUnseen》, 다이슨 갤러리, 런던, 영국
2017 《Khojaly Peace Prize》, 영국 의회(웨스트민스터궁), 런던, 영국
수상
2022 제20회 금호영아티스트 작가 선정, 금호미술관
2021 EX-UP 작가 선정, 상업화랑
2021 RE:SEARCH 예술기반지원, 서울문화재단
2021 예술창작활동지원, 서울문화재단
2020 송은아트큐브 작가 선정, 송은문화재단
2017 Khojaly Peace Prize, 후보 선정, 영국 의회(웨스트민스터궁), 런던, 영국
[전시 설명]
Double Retina
작가 정영호는 사진 매체를 기반으로 동시대의 기계 장치가 세계를 이해하고 감각하는 우리의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스크린을 통한 전자적인 경험의 세계와 눈을 통한 직접적인 경험의 세계의 간극에 주목하는 작가는
이번 개인전 《Double Retina》에서 두 세계를 중첩시켜 보여줌으로써 그 사이의 관계와 균형을 드러내고자 한다.
전시장에는 작가가 직접 본 장면을 촬영한 흑백 필름 사진과 스마트폰 스크린을 통해 본 장면들을 담은 컬러 사진이
병치되어 나타나 있다. 이는 신체를 통해 감각할 수 있는 정보와 신체의 역할을 대신하는 기계 장치를 통해 감각할 수
있는 정보를 대비시켜 보여준다. 디지털로 환원될 수 없는 흑백 사진만의 물성과 촉각적인 감각은 사진이 몸담고 있는
장치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킨다. 특히 사회적 사건이 보도된 이미지를 스마트폰 스크린에 띄워놓고 근접
촬영한 컬러 사진 위에 각 사건의 현장에서 작가가 직접 촬영한 흑백 사진을 중첩시킨 레이어 작업은 하나의 사건을
감각하는 두 세계의 격차를 드러낸다.
[작가-비평가 매칭 프로그램]
질기고 매끄럽고 뒤틀린, 어떤 믿음의 가능성처럼
- 김현호
1.
그는 마치 세계 기록에 도전하는 엘리트 운동선수처럼 작업한다. 굳이 비유하자면 레슬링이나 장대높이뛰기 정도가 어울리겠다. 꾸준히
자신의 기예를 연마하고, 단련된 신체와 전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목표를 향해 조금씩 나아간다.
그 목표는, 조금 거창하게 말하자면, 자신의 손과 카메라를 통해서, 사진의 경계를 조금이라도 넓히는 데 있는 듯하다. 물론 작가는
자신의 작업을 이렇게 투박한 언어로 정의하는 일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초기의 작업 노트에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정영호가 자기 작업의 목표로 제시했던 것은, 대체로 우리가 사는 세계 그 자체를 이해하는 일이었다. 즉 집회 현장의 뜨거운 구호를
베어내어 전혀 다른 시공간에 가져다 두었을 때 그 언어의 질감과 시대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려 했던 <독백집회>
(2017~2018) 연작이나, 물리적 실체 없이 떠도는 온라인의 여론과 정보, 가짜뉴스와 혐오의 데이터를 3D 오브제로 출력하여 촬영한
<비사진적 사례들>(2021) 등이 그 좋은 예다. 작가는 정보와 언어, 매체, 시공간의 맥락 등을 이해하기 위해 사뭇 집요한 시도를 거듭해
왔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정영호가 그 이해의 수단으로 한결같이 사진을 선택한다는 점이다. 아니, 어쩌면 ‘선택'이라는 말이 그리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말은 자신의 개념을 물질 세계에 구현하는 데 있어 사진이 가장 적합한 매체일 때 이를 ‘선택하는' 개념미술가들, 즉 존 발데사리나 조셉 코수스의 후예들에게나 어울린다. 반면 작가 정영호는 사진의 영토에 사는 거주민으로서, 빛과
렌즈와 카메라와 입자의 가능성을 더욱 확장하기 위해 전진과 후퇴를 거듭한다.
다소 무망하게 느껴질 정도로 진지한 도전과 야망이 작가 정영호의 작업에 독특한 질감과 뒤틀린 주름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형체도
냄새도 없이 온라인을 떠도는 증오와 혐오를 우리 눈 앞에 들이밀고 싶은 예술가가 있다고 하자. 그는 아마 그 말뭉치를 분석하고
정리하여 이를 입체적인 그래프나 오브제로 스크린에 구현할 것이다. 정영호도 그렇게 한다. 예술가들은 그 그래프와 오브제가
생성되고 출력되는 방식에 있어 자신의 의도와 개념, 미감을 투여할 것이고, 이를 교란하여 다른 매체로 전환할 수도 있다. 물론
정영호도 그렇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사진을 택한다. 즉 정영호는 숙련된 사진적 기예를 바탕으로 3D 프린팅된 오브제를 정교하게
촬영하여 그 촉감을 생생하게 드러내거나, 스마트폰의 스크린을 정밀하게 찍어서 형체 없는 데이터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는 이미지가
사실 물리적 화소의 집합체라는 것을 보여준다.(<Facing Shopping>,
생각해 보면, 엘리트 운동 선수가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최초의 조건은 자신의 종목에 대한 강고한 믿음이다. 예를 들어
레슬링이라는 종목의 영속성을 믿지 않는다면 굳이 매일매일 땀을 흘리며 밧줄을 탈 이유는 없다. 레슬링의 역사와 가치, 제도와
생태계를 의심하지 않아야만 자신의 지점과 목표, 훈련 방법을 상상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때 레슬링이 올림픽 정식 종목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사진 역시 예술 매체로서의 가능성을 잃고 디지털 이미지들 사이로 그저 녹아내릴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사진에서 이제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던 폴 비릴리오의 말과 거의 비슷한 종말론적 언술들이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발화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말은 역사가나 비평가의 것이라기보다는, 신경증을 앓는 선지자의 그것에 가깝다. 종말론적 욕망이 서구 역사의 특정
지점을 견인해 온 것은 분명하지만, 이는 미래를 고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거기에 이르는 길은 단선적(unilinear)이며, 자신은 이를
내다볼 수 있다는 착란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낡고 허술하다. 사진의 역사에서 복제와 조작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은 적은
없었으며, 사진의 역량은 언제나 그 기계적 신뢰성보다는 믿음과 의심이 뒤엉킨 불안정한 결속에서 비롯하곤 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이
비평적 판단으로서는 지나치게 조악하다 하더라도, 비평적 대상으로서 무의미하지만은 않다. 아마 이런 말들을 거칠게 요약하면
‘사진이 예전 같지 않다' 정도가 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들은 꽤 중요하다. 대중들의 관심이 없다면 레슬링이
스포츠 제도에 남을 수 없듯이, 사진 역시 충분한 욕망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매체로서의 가능성을 확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진사가
제프리 배첸은 초기 사진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한 적이 있다. 그에 따르면 사실 사진을 구성하는 기술들은 사진이 발명되기 훨씬 오래 전에 구체화된 것들이다. 예를 들어 빛을 받은 염화은의 입자가 검게 변한다는 것, 어두운 방이나 상자에 작은 구멍을 뚫어
렌즈를 끼우면 한쪽 벽에 외부의 이미지가 맺힌다는 것 등이 모두 그렇다.
하지만 이런 기술들은 마치 현상되지 않은 필름의 잠상처럼 오랜 시간을 보내다가, 18세기 말과 19세기 초반의 시기에 갑자기 수많은
‘원시 사진가'들의 욕망이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하면서 결합하고 제련되어 사진술이라는 형태로 구현된다. 그러므로 중요한 문제는 ‘누가
사진을 (조금 먼저) 발명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시공간에서 사진을 상상하는 일이 가능했는가'라고 그는 지적한다.
3.
배첸의 지적에는 깊은 설득력이 있다. 19세기는 발명의 시대였고, 여러 기술들이 결합하고 경쟁하며 수많은 기술과 기계들이 새롭게
태어났다. 그 과정은 기술적 지식보다는 강렬한 욕망을 요구한다.(심지어 열역학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도 증기
기관은 태어났다) 즉 충분한 욕망과 상념들이 끓어올라 임계점을 넘은 이후에야 사진은 탄생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사진은
대중의 욕망을 가장 뜨겁게 견인하는 기술이었으며, 그 욕망 중 가장 끈질기고 뒤틀린 부분이 예술적 열망이었다는 점에서 괴이하다.
이후로도 사진사의 중요한 국면은 대체로 과도한 예술적 욕망과 실리적 욕구가 서로를 짓누르고 쥐어짜듯이 만들어지곤 했다.
오늘날의 디지털 환경에서 사진은 점점 더 강한 힘을 지니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충분하고 다양한 예술적 욕망과 시도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예술 매체로서의 가능성은 점점 축소될 것이다. 수묵을 흉내낸 단조로운 풍경과 물신주의에 가까운 프린트, 호소에
에이코와 모리야마 다이도의 계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친 스냅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오늘날 흑백 사진의 매체적 가능성이 점점
소진되고 있듯이.
그런데 정영호의 이번 연작은 바로 그 흑백 사진을 다룬다. 사실 이것이 그의 작업 맥락에서 그리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정영호의 중요한 전제 중 하나는 사진의 영역이 단지 시각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즉 그에게 있어 사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움이나 증오도 찍을 수 있으며, 촉각적인 질감도 전달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존재다. 사실 사진의 영토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흑백
사진은 서로 다른 시큼한 냄새가 나는 여러 종류의 미끈한 액체를 통과하는 후각적이고 촉각적인 매체다. 또한 화이버 베이스 인화지를
손으로 만졌을 때의 부드러우면서도 질기고 단단한 물성은 어떤 소재와도 비교할 수 없이 강렬하다.
즉 정영호의 이번 전시 《Double Retina》는 흑백 사진의 역량과 가능성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수묵을 흉내내거나
장노출을 걸어 안온하고 정갈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의 관심사는 아니다. 정영호는 흑백 필름과 젤라틴 실버 프린트에는 여전히
예술 매체로서 탐구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믿고, 무엇보다도 전시장의 공간에서 이를 만난 관객들이 이를 알아챌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작가는 (위에서 언급한 호소에 에이코 스타일의 스냅처럼 보이는) 자못 낡아 보이는 사진들을 전시장에 내놓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은염 사진들은 사진이 다루는 빛과 어둠, 그리고 렌즈의 한계를 가장 직설적으로 드러낸다. 또한 후각과 촉각을 강하게
자극하며, 입자의 다발에 불과한 사진이 갑자기 욕망으로 들끓어오르는 임계점을 여실하게 보여준다. 즉 이번 정영호의 작업은 사진의
영토에 사는 이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신체성이 강한 매체에 가깝다. 그는 공간을 걷는 관객의 신체에 자신의 사진이 작동할 수 있다고
믿는다. 또한 스크린의 픽셀을 찍은 자신의 기존 작업과 뒤틀린 은염 인화지를 함께 병치했을 때, 관객들이 사진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지닌 괴이한 불안정성을 간파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모두가 늙음을 경멸하고 새로움에 대해 강박적으로 몰두하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이런 믿음을 만나면 조금쯤 아연하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끊임없이 갱신되는 신선하고 화려한 이미지들을 가져오라는 명령이야말로 사진의 가장 낡고 오래된 생산 구조에 속하며, 작가
정영호는 이를 거부한다. 그의 탈주 시도가 성공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사진 매체에 대한 실험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며
웅웅거리는 종말론자들의 세계에서, 온몸의 근육을 잔뜩 긴장시킨 채로 경기장으로 들어서는 이의 진지한 뒷모습은 충분히 눈길을 끈다.
이 글은 작가 정영호의 전시 《Double Retina》가 열리기 전에 씌어졌고, 작품과 설치 계획을 모니터로 미리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공간에서 어떻게 관객의 신체에 전달되고 작동할 것인지를 알아채기는 불가능했다. 그러나 작품을 보기 위해 방문한 정영호의
작업실에서 오랜만에 만져본 화이버 베이스 인화지의 촉감은 여전히 손끝에 생생하다. 그것은 마구 우글거리고 매끄럽고 반짝이고
질기고 단단했다. 마치 오늘날의 사진 이미지들이 살아가는 뒤틀린 세계가 대체로 그러하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