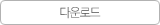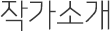최은빈
nuslowolsun@gmail.com
2020 파리 8대학, 미술사 마스터1, 파리, 프랑스
2018 부르주 국립미술대학교, 순수미술 석사, 부르주, 프랑스
2015 부르주 국립미술대학교, 순수미술 학사, 부르주, 프랑스
주요 개인전
2024 《Island》, 금호미술관, 서울
2023 《가까스로 가까이에》, 테미예술창작센터, 대전
2022 《점, 선, 그-ㄹ 사이》,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 영천
주요 단체전
2023 《89 Mile》,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2023 《Preview》, 테미예술창작센터, 대전
2022 《청년미술프로젝트 22:경계점》, EXCO, 대구
2022 《서울-제주 시각예술 신진작가전》, 제주문예회관, 제주
2022 《이음》, 시안미술관, 영천
2022 《8x∞》,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 영천
2022 《Wave of Arts》, 노원문화예술회관, 서울
2017 《Le Nomad》, 100 Lieux D-Multiples, 오레, 프랑스
2016 《Palèmètrébo#5 : Je me soucie de vous》, Jacques Coeur Palace, 부르주, 프랑스
레지던시
2024 예술소통공간 곳, 춘천
2023 테미예술창작센터, 대전
2022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 영천
수상 및 선정
2024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활동지원 선정, 서울문화재단
2023 제21회 금호영아티스트 선정, 금호미술관
2017 29회 앙제 영상제, 유러피안 대학 단편 영상 부문 수상, 앙제, 프랑스
프로젝트
2017 Project: Liaison-Douce(셰르 시 주최), 부르주, 프랑스
[전시 설명]
Island
작가 최은빈은 개인의 경험, 기억, 감정과 같이 가공되지 않은 무형의 가치들을 영상, 설치, 사운드 등 여러
매체를 통해 공간에 재구성한다. 그의 작업은 일기, 독백, 대화처럼 일상에서 마주하는 찰나적 순간을 기록한 파편적
언어에서 파생된다. 작가는 자신이 상상한 언어의 본질적 형태를 빛, 진동 등의 비물질적 요소로 변환하고, 이는
관람객의 물리적 개입으로써 기하학적 공간 속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실시간 영상 작업과
초지향성 스피커를 사용한 사운드 작업을 통해 관객의 시각적, 청각적 감각을 확장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재함'의
재현 가능성에 대해 탐구한다.
[작가-비평가 매칭 프로그램]
-I-s-l-a-n-d-
- 권혁규(전시기획자)
아무런 동기나 핑계 없이 다가오는 장면들이 있다. 우연히 발견한 사진 한 장, 뜻밖의 장소에서 마주한 풍경, 평범한 일상이
생경해지는 순간들처럼 가히 원시적이라 할 만큼 이유 없이 내 안의 무언가와 연결되는 장면들이 있다. 뭐라 정의 내릴 수
없는 그 장면들은 어떤 이해나 설명 없이 내부 깊숙한 곳으로 들어온다. 그렇게 회오리치는 감정과 깊은 사색, 심지어는
깨달음(의 착각)을 만들어 낸다. 그것은 일종의 침입이기도 혹은 즉각적 동요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그 장면들은 공격과
부정성의 범주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오히려 삶의 일부를, 어떤 기원을 운명적으로 마주하는 것처럼 외부를 향한 불신을
해소하고 또 해명한다.
최은빈 개인전 《Island》는 앞서 언급한 경험들을 떠올린다. 한적한 바닷가 백사장에서 한참 동안 쳐다본 -
백사장에 꼽힌 쇠기둥에 묶여 바람에 휘날리는 밧줄 매듭 – 장면과 유난히 추웠던 겨울날 밤의 기억 - 가로등 그림자와
본인의 그림자가 포개지는 순간 - 등 여전히 내 안 어딘가에 남아있는, 현재의 또 다른 순간들과 연동되는 장면들을
조심스럽게 불러낸다. 당시 나의 자화상 같은 특정 시기의 정서와 기억이, 어쩌면 너무나도 사적인 지각의 흔적이 뿌리 없이
떠 있는 부표처럼, 망망대해의 작은 섬처럼 나타난다.
이 순간들은 전시에서 맥락이 적당히 소거된 스냅사진처럼 혹은 연극의 한 장면처럼 가설된다. 오로지 전시를 위해
존재하고 또 전시와 함께 사라지는 상황들은 말 그대로 일종의 허구적 연극과도 같다. 여기서 허구적이라는 건 전시가 특정
사건이나 장면을 묘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이 정보를 선행하고 초월하는 경험을 의도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전시는
관념이 아닌 현존으로 제시되며 분명한 현실 속 초현실적이었던 장면들처럼 선입견 없이 실시간으로, 분명하게 지각되기를
시도한다. 너와 나 이곳과 저곳의 섬 ‘사이에서' 튀어 오르는 본능적인 흡수를 의도한다.
《Island》는 크게 (2024)과 (2024)의 두 작업으로 나뉘어 구성된다. 먼저 보게 될
에서 관객이 마주하는 건 빈 공간뿐이다. 여백을 확인하는 경험이 무덤덤하게 강조된 공간에서 관객은 상호
변증법적 긴장을 경험하게 된다. 여기서 특정 대상을 본다는 전시의 관습적 행위와 맥락은 다소 기이한 방식으로 우화화된다.
전시장에 들어선 관객은 볼 게 없는 전시의 기대와 실망을 조금 다른 서스펜스로 이동시키며 저 멀리 맞은편 벽에 뚫린
구멍에서 새어 나오는 파란빛을 따라 몸을 이동하게 된다. 그렇게 구멍 안을 들여다본 관객은 파란 배경 속에 존재하는
역시나 파란 자신의 뒷모습을 발견하며, 시각성을 부정하는 공간에서 본인의 뒷모습을 보게 되는 패러독스를 경험한다.
이처럼 대리인으로서 나를 확인하는 상황은 보기의 기존 권력과 방식을 준거한다기보다 그 위신을 분산시키는 쪽으로
나아간다. 파란 화면은 얼핏 가상과 모방, 혹은 눈속임의 블루스크린을 떠올리게 하지만 실제 작업은 보다 근본적인 시각성의
탈주와 진전을 의도하는 듯 보인다. 그것은 무조건적인 보기와 포착하기, 또 일방적인 이해로부터 벗어나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끌어안고 감각하는 어떤 유예의 긴장을 만들어 낸다.
이어진 공간의 에서 유예의 긴장은 반복되고 환원되는 미지의 그림자로 연결되는 듯하다. 전시장
가운데는 기둥이 세워지고 그에 붙은 조명과 스피커는 방향성을 갖지만 이동한다 말할 수 없는 내부적이고 한정적인 빛과
사운드를 만들어 낸다. 또 여기서 들려오는, 문맥을 파악할 수 없는 단어들은 어떤 배치들을 조직하고 다시 흩트려 놓는다. 이 반복적 변동과 포개짐, 그리고 어긋남은 의 파란 배경 속 파란 뒷모습과 함께 그림(자) 속 그림(자),
극중극처럼 상봉하기 어려운 두 개의 상황을 콜라주해내며 이중 이미지를 배가시킨다. 제목 표기가 비슷한 두 작업,
과 은 그렇게 분리와 구분이 아닌 그 자체로 관계 맺기 혹은 극대화하기를 도모하며 공통의 정서를
엮어내는 데 집중한다. 의 얼핏 스산하고 냉소적인 정서는 과 마찬가지로 실제 경험과 기억의
덩어리이자 유연한 파편이라 할 수 있다. 공허하고 낯설게 제시된 상황은 보편적 범주화를 이탈하고 독자적인 인식의
원천으로 존재하며 직관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내보인다. 동일한 해석이 불가능한 이 직관이 따로 증명할 필요 없는
세계/경험의 현실태가 아닐까 생각한다.
최은빈은 이번 개인전뿐 아니라 이전 작업에서도 줄곧 육체의 눈으로 장면이나 대상을 지각하게 했다. 작가의
작업은 분명 특정 대상/장면의 관찰과 관조, 사고의 과정을 관통한다. 그것은 무언가를 경유하고 또 모방한다. 하지만 실제
전시에서 그 과정은 장면의 외형적 복제가 아닌 정서적 중용의 회복으로 이어진다. 다시 말해 실제 전시는 본 감각을 내재한
낯섦으로 다가오길 시도한다. 여기서 발견되는 구상성과 직관성은 앞서 설명한 《Island》의 연극적 설정과도 상통한다.
작가는 선험적 추론이 아닌 실제 공간에서 감각하고 경험하는 과정을 전시의 중심에 위치시킨다. 그것은 얼핏 전시의
시각성을 부정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 무엇보다 현존으로서의 전시를 강조한다. 그때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경험되는 세계,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감각과 사고는 이 텍스트를 포함한 여타의 이미지나 자료가 아닌 오직
전시에서만 가능해진다.
그렇게 최은빈은 전시에 두 개의 큰 축을 건설한다. 과 의 두 공간으로 나뉘고 또
이어지는 《Island》는 작가 스스로에게는 물론 관객에게도 동일한 경험과 창작을 요구하는 듯하다. 작가가 경험한 정서를
응고해 넣으면 관객을 그것을 감각하고 용해해 자신의 경험으로 치환한다. 어느 한쪽이라도 무너진다면 전시는 온전히
성립하지 못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최은빈의 작업은 애초에 허구적, 사적 묘사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허구적 묘사는
단순 재현이나 흉내가 아닌 경험의 공유와 또 다른 창작을 의도한다. 물론 “꿈꾸는 자는 자신이 꿈꾸는 것을 모르지만, 영화
1)
관객은 자신이 영화관에 있다는 사실을 안다.” 전시의 관객들은 분명 자신의 감각과 경험이 모방과 의도에서 파생된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흉내 내는 데 그치지 않는 것은 작가뿐 아니라 관객도 마찬가지이다. 관객이 모방하는 것은 장면이 아닌
정서와 감정이다. 그것은 작가가 작업을 시작한 동기와 비슷한 것일지도, 그렇게 된다면 전시는 궁극적으로 특정한 정서를
공유하는 ‘Island'를 형성할지도 모른다. 저 아득한 과 의 모래사장에서 관객은 어떤 발자국을
남기게 될까. 그들은 자신의 발자국을 인지할 수 있을까. 전시에서 그들은 꿈꾸는 자와 달리 주체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창작하고 운영할 수도, 그렇게 자신만의 장면을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