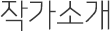금호미술관
이해반 / 2024년 22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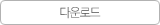
이해반
www.haevanlee.com
2022 헤이그 왕립 예술 아카데미 아티스틱 리서치(Artistic researh) 전공 석사
2020 《강 하류에서 꿈꾸기를 한 조각상》,갤러리 룩스, 서울
2018 《Goliaths Tanks》,평화문화진지, 서울
단체전
2022 《In Media Res : ticket to the future》, Omstand,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2021 《In Pending Waters》, De Helena, 헤이그, 네덜란드
2021 《보더리스 사이트》, 문화역서울284, 서울
2021 《Sun Kissed//Fog off》, Quartair, 헤이그, 네덜란드
2020 《Bangkok Art Biennale》, Bangkok Art and Culture Centre(BACC), 방콕, 태국
2020 《The Cosmic Race》, Palado de La Autonomia, 멕시코시티, 멕시코
2019 《Full Metal Jacket-자유와 관용의 딜레마》, 강원국제예술제, 홍천(구)탄약정비공장, 강원도
2019 《DMZ》, 문화역서울284, 서울
2019 《다섯 개의 달: 익명과 미지의 귀환》, 평창비엔날레, 강원도
2021 Artist in Retreat Residency, 론네뷔, 스웨덴
수상 및 선정
2023 Stroom Den Haag PRO Invest Award, 헤이그, 네덜란드
프로젝트
2021 Future School Summer Studio: Transborder Lab,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워크숍
[전시 설명]
히든 블루밍 Hidden Blooming
작가 이해반은 한국의 비무장지대(DMZ) 인근 지역에서 성장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가 접경 지역에서
발견되는 경계의 구조와 그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탐구한다. 작가는 국가 간의 충돌을 피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존재하는 완충 지대가 인간의 개입 없이 자연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공간이면서도, 감시와 저지를 위한 군사적인
장치가 공존하는 장소라는 점에 주목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비무장지대의 자연 속 보이지 않는 경계를 상징하는
오렌지색을 중심으로 폭발의 이미지를 담은 풍경 회화 연작과 벽화, 오브제 작업을 선보인다. 이를 통해 작가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완충 지대의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속성을 시각화하며 경계 지역에 대한 우리의 시선과 태도에 질문을
던진다.
[작가-비평가 매칭 프로그램]
비평 - 사이-지대의 풍경
- 장진택
‘풍경(風景, Landscape)'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로부터 상정되는 삶에 관한 하나의 표상과 다름없다. 이 경우에
자연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결정하는 가장 주요한 조건이자 요소 그리고 계기가 되고, 순차가 무효한 상호작용의
결과로써 당대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을 특정하게 이룬다. 따라서 보는 것 혹은 보이는 것으로의 귀결인 이 풍경은 그 표면과
이면을 각기 두고서 부유한다고 하겠다. 때문에 창작자를 포함하는 관람자들에게 이 풍경의 형식은 그야말로 상반하는
양가적 가치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열린 매체(Open format)'로 이해될 수 있다. 이로써 풍경의 범주에서 보통 단수적(Sin
gular) 개념으로 용인하는 명료성은 복수의 갈래로 분화하며, 이때 예술의 구조에서 가장 기본의 이치라고 할 수 있을
임의의 주관성과 대상의 객체화 과정이 연동하기 시작한다. 물론 예술의 갈래들 가운데서 풍경이 유일한 형식으로서 이상의
원리를 작동케 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역사의 맥락에서 그것이 가장 원초적인 층위에 자리하고 있음을 부정키도 어렵다.
다시 말해 예술을 기능하게 함에 있어, 소위 기원적인 위상을 점유하는 풍경은 사회 구조의 다양화로 인한 매체 차원에서의
변화 와중에서도 선험적인 역할을 해 왔다. 이렇듯 미적 상호작용의 기초 양식으로서 풍경의 지위를 조명할 때, 그 의미의
해석은 다중의 방식으로 다채로워진다. 더불어 풍경은 구체적인 무엇으로 존재할 필요를 (어쩌면) 의도적으로 자기 상실하는
상황을 연출하는데, 그 순간 창작의 주체도, 향유의 주체도 기존의 책임과 의무로부터 역시나 꾸밈과 억지가 없는 ‘자유
의지(Free will)'를 표명할 준비를 마친다. 그리하여 더는 실재하는 것으로 풍경은 그려지기보다 사유의 투사체로써
완결한다. 마치 객관적 산수(山水)와 주관적 풍경의 다름처럼, 재현 대상으로서의 단순 기록적 증거가 아닌, 주체의 철학적
관점을 선험적으로 현시하는 시감각적 모델로 이를 구축한다. 흥미로운 건, 형이상학의 영역에서 이러한 풍경의 임의성은
서로를 객체로 상정하는 이질한 주체들의 세계 간 차이에 기인하는 충돌 발생의 확률을 퍽 효율적으로 감쇄해 낸다는
사실이다.
이해반의 작업은 그처럼 풍경의 형식을 빌려 현실을 최대한 이상적인 등위로 승화하려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작가의 미적 시도는 구체적인 지역성을 수반하기를 결심함으로써 그 괴리를 무화한다. 특히나 겹치고 쌓아 올린 층위의 최종
단계에서 곧 현실을 가로질러 다다른 초현실을 재현하는 그의 이미지가 지극히 사실의 범주인 ‘현장 연구(Field research)'
기반의 탐색 활동에 바탕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인상적이다. 이상의 방법론을 따르는 작가의 실천은 그렇게 다음과 같은
결과에 도달하는데, 결국 작가가 그려내는 풍경 그 자체는 어떤 사회 정치적 입장으로서 자명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
기존의 양자택일적 상황을 ‘사이(In–between)'에서 대신하는 대안적 확장(혹은 완충)의 지대를 드러내는 것이 되기도 한다.
이는 다단하고 복잡한 자기 양식화의 과정, 즉 개별의 작품들이 각기 그리는 개별 풍경의 구상을 통해 담론을 경화(硬化)
하면서도, 그로부터 예술과 사회의 관계망 내에서 예술의 의미를 당대적으로 직조한다. 그렇듯 작업이 향하려는 일상의
사유를 시사하기 위해 작가는 도리어 전혀 무관해 뵈는 아름다운 상상의 풍경을 상연하며, 해당의 행위는 곧 무언가를 어떠한 관점으로 볼 것인지의 논제를 창작과 관람의 연결망으로 아우른다. 극단의 선택이 당연해져 버린 동시대 ‘주체–되기
(Subject–becoming)'의 조건 아래서, 이미 누군가의 환경이 되어버린 그것은 세분된 표현의 일환들로 산재하고, 동시에
상호 점철한다. 때문에 이해반의 풍경은 장소적이기도 하지만, 특정한 개인과 집단의 기억을 내재한다는 점에서 또한
시간적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이율배반형 개념의 구성은 작가의 표현적 효과를 재정립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형식,
내용, 태도의 부문들은 그로써 서로가 서로를 붙잡고 뒤엉키어 이른바 총체의 예술로 스스로를 정의한다. 이상의 진리를
기술하는 이해반의 풍경은 따라서 그 깊이를 다시 가늠해야 할 이미지 레이어의 집적으로 해제될 수도 있겠다. 본다는 것은
단순히 대상의 확인에 그치는 일이 아니며, 형식의 차원은 태도와 생각을 형성하는 데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상식의 통용은 바로 그곳에서 개진된다. 생각하지 않았거나 그럴 수 없었던 것들을 상기함으로써, 작가는 척박한 의식의 땅을
개간한다.
역설의 묘사로서 이처럼 이해반의 풍경은 극렬한 고통의 상징으로 아름다움을 끌어안고, 혼란을 초래하는 작금의
질서에 필요한 균열을 내고자 한다. 신체 감각을 통한 인지 과정의 주체로서 인간의 삶을 관장하는 시감각의 정보는, 여기서
자극의 연속으로 무디어진 우리 일상의 생활을 생산적으로 의심케 돕는다. 일관성을 외연하는 미적 매체 속성과는 무관한
이미지로서 그의 풍경은, 이를테면, 역사와 같이 견고하고, 그리하여 잘 변하지 않는 존립의 조건을 전에 없던 방식으로
유연하게 전환한다. 이것은 분명 인식과 지각의 문제와 연관이 있을 터, 누군가가 무언가를 재고토록 하는 일은 결코 풀기
쉬운 과제가 아니다. 기저의 성질은 은연하기에 기저라 한다. 다만 그것을 한 번 알아차리고 나면, 무언가를 이루는 형식은
이제 그 공통의 특징으로써 사유의 안과 밖을 실질과 함께 관통할 수 있게 된다. 가장 단순하고도 보편적인 심상으로부터
차원은 자기 경계의 의미를 비로소 새롭게 기술할 일정한 상태에 돌입한다. 적극적 관찰의 의지보다 자연스러운 응시의
유도가 때로는 상대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다. 작가의 작업이 갱신하는 관계는 세계와 자아 사이를 동기화(Activation)한다.
어떤 문학적 수사를 차용하더라도 예술적 상상의 통로를 지지체 삼아 그리는 그의 ‘다큐–픽션적(Docu–fictional)' 풍경은
가히 ‘인공적(Artificial)'이다. 제 이해관계에 기인해 인간의 존재가 초래하고만 여러 비극적 현상들은 특정의 시대에
국한하지 않는 ‘합의된 올바름(Correctness)'의 가치를 돌이켜, 그를 재편하는 데 일조한다. 당장의 구조를 완전히 허물고서
원점(Zero base) 지대를 건축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회(Detour)'의 전략으로 적어도 이를 수정할 여지의 창출을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거다. 주체가 주체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한다는 건, 아마도 끊임없는 산파를 통해 계속해서 참된 진리를 자각하려
함을 말하는 것일 테다. 현실의 초월로부터 다른 현실을 실현한다. 이해반의 풍경은 그렇듯 건전한 변화를 촉발하는 일종의
‘정신역동(Psychoanalysis)'의 가능성으로서 일반의 범주를 한층 넓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