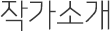금호미술관
강나영 / 2024년 22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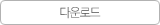
강나영
2016 영국왕립예술학교 석사, 조소과 졸업 Sculpture, Royal College of Art
단체전
2023 서울문화재단 2차 선정, 서울문화재단, 서울
[전시 설명]
외출하는 날 A Sundat Outing
작가 강나영은 ‘돌봄 노동'과 그 안에서 형성되는 관계에 주목하며, 입체와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그의 작업은 돌봄이 이루어지는 삶의 구조와 그 안에서의 물리적, 정서적 긴장을 섬세하게 포착하며,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강한 육체적 힘과 정신적 집중을 요하는 노동이 된다는 점을 환기한다. 강나영은 이러한
반복적이고 조율이 필요한 일상 속에서, 돌봄이라는 책임이 왜 여전히 가족의 몫으로만 남아 있는지 질문하며 그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을 드러낸다. 이번 전시는 장애가 있는 가족 구성원과 함께 외출하는 과정을 따라가며, 엘레베이터부터
자동차, 영화관 좌석에 이르기까지의 여정 속에 내재된 심리적 층위를 내러티브 중심의 영상과 설치 작업으로 풀어낸다.
이를 통해 일상의 단순한 행위들이 특정한 신체에게 얼마나 복잡하고 무거운 과제가 될 수 있는지를 드러낸다
[작가-비평가 매칭 프로그램]
크립 어트랙션(Crip Attraction)
- 이연숙(리타)
강나영의 개인전 《외출하는 날 A Sunday Outing》은 강나영이 쓴 에세이에서 출발했다. 에세이는 돌봄 수혜자인 강나영의
남동생 K와 돌봄 제공자인 강나영의 가족이 함께 외출하는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엘리베이터,
자동차, 지하 주차장, 영화관에 이르는 소위 ‘일상적인' 수준의 이동이지만 이들에게는 매분 매초 정확히 짜인 돌봄 노동의
안무를 따라야 겨우 통과할 수 있는 장벽(barrier)의 연속이다. 물론 이 장벽은 단순히 돌봄 수혜자와 제공자를 진땀 빼게
만들며 고생시키는 물리적인 장벽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과 같은 심리적인 장벽이기도 하다. 돌봄 제공자로서
강나영은 K와 함께 외출할 때마다 장애를 가진 몸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피부에 달라붙는 것을 “몸으로”
감각하며 일촉즉발의 불안과 긴장을 느낀다. 그러니 집 안에서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재활'이라는 이름의 시뮬레이션 훈련과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시작되는 “외출이라는 실전”은 난이도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K를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사람들의 눈치 또한 살펴야 하기에 거의 외과 수술적인 고도의 집중력과 섬세함이 요구되는 돌봄 노동의 안무는 돌봄
수혜자와 제공자가 행하고 드러내는 모든 단위의 움직임에—심지어 “한숨”과 생리 현상에도—적용된다. 그리하여 걷고
이동하고 식사하고 영화보고 수다떠는 ‘평범한' 여가의 코스는, 매 단위 마다 “고심하고” “기다리고” “부축하고” “땀 흘리며
고군분투”하는 “미션”들로 재구성된다.
에세이에 말미에서 우리는 놀랍게도 주말 오후 어느 가족이 이 모든 걸 제 시간에 맞춰 전부 해냈다는 걸 알게 된다. 그러나
‘제 시간', 그건 돌봄 수혜자의 시간도 돌봄 제공자의 시간도 아니다. 제 시간은 다름 아닌 비장애중심주의(ableism)의
시간이다. 각기 다른 장애를 가진 몸이 언제나 겨우 도착하거나 늦거나 아니면 아예 출발하려는 시도조차 할 수 없을 그런
엄격한 기준을 따르는 시간이 바로 제 시간이다. 제 시간은 모두가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목표를 향해 전진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아파 본 누구라도 동의하겠지만 아플 때에 ‘평범한' 매일의 행위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힘들고 복잡한 “미션” 혹은 여러
움직임 단위의 복합체인 ‘프로젝트'처럼 느껴진다. 더욱이 “느린 걸음, (더디게 움직일 수도 있는) 활동 지원사에 대한
의존성, (휠체어에서 보청기에 이르는) 장비의 오작동, 장애인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버스 운전사, 낯선 사람과의
장애차별적인 마주침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만성 질환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제
시간에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시간” 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장애학자 앨리슨 케이퍼는 ‘크립 타임(Crip time)' 을
언급하며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더 많은 시간'은 문자 그대로의 시간 연장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제각기 다른 속도로 다른
목표를 향해 움직일 수 있는 ‘유연한' 시간에 대한 요청이기도 하다고 쓴다. ‘엄격한' 제 시간의 기준에서 늘 늦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옷을 갈아입는 것만으로도 준비된 ‘스푼'을, 체력을 전부 소진하는 사람들이
있다. 단 몇 시간의 외출을 위해 매일 시뮬레이션 훈련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크립 타임은 이처럼 “장애 있는 몸과
마음에 시계를 맞추는 대신, 시계를 장애 있는 몸과 마음에 맞추는” 관점이자 태도다. 이러한 관점과 태도는 물론 “속도와
일정에 대한 기대의 규범화와 정상화에 도전”할 수 있게 하지만 근본적으로 세상이 지향하는 ‘제 시간'을 거스르기에
세상으로부터 쫓겨나고 떨어져 나온 고독과 슬픔, 수치와 비탄을 수반한다. 그럼에도 중요한 건 여전히 거기에 고유한
리듬, 고유한 규칙이 있다는 사실이다.
작년 개인전 《헤비-듀티 Heavy-Duty》 를 시작으로 강나영은 크립 시간(성)을 이루는 고유한 리듬과 고유한 규칙에
주목해 왔다. 그는 이 전시에서 특히 ‘사랑'과 ‘희생'과 같은 낭만적 수식으로 치장되기 쉬운 가족 간 돌봄 노동을 현관, 식탁,
화장실과 같은 사적 공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익명적 몸들의 유기적, 관계적 안무로 재의미화한다. 한편 이번 개인전
《외출하는 날》에서 강나영은 돌봄 제공자로서 돌봄 수혜자와 함께 크립 타임에서 살아가는 경험이 제공하는 심리적 현실을 영상, 오브제, 설치/구조물—혹은 ‘장벽'의 형식으로 번역한다. 어차피 크립 타임이라는 ‘리얼 월드'의 관점에서 세상 전체는
장벽으로만 이뤄져 있다. 빠르고 편한 수직 이동 장치인 엘리베이터는 <10층 The 10th Floor>에서 공황이라도 유발하려는
듯 금속 재질을 번쩍이며 급격히 좁아지는 비현실적인 원근감을 과시하는 일종의 고문 기구처럼 보인다. 한눈에 봐도 누구도
걸을 수 없을 것 같은 <누구나 걷는 길 The Road We All Walk>은 ‘배리어프리'를 표방하는 시설물에 대한 풍자처럼
기능한다. <하늘, 바람, 땅 The Sky, The Breeze, The Earth>은 전시 제목처럼 매주 주말 자동차를 주된 이동 수단 삼아
외출하는 강나영의 가족을 360도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스티로폼 조각에 투사한 작업이다. 강나영의 가족에게 이 시간은
이쪽 지하 주차장에서 저쪽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할 뿐인 “매우 짧고 빠른” 시간이지만 동시에 간접적으로나마 ‘하늘, 바람,
땅'과 접촉할 수 있는 “기분이 좋고 설레는” 시간이기도 하다. <우리에게 일요일은 자갈밭 위의 고깃집이다 Our Sunday>는
제목 그대로 강나영의 가족이 매주 주말 겪어야 하는 실제 상황을 재현하는 동시에 자갈밭 중앙에 놓인 LED 조명이 설치된
고깃집 모형을 통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연약하고 작은 행복의 구체적 형태를 제시한다. 그러므로 강나영은 이동에 큰
어려움을 주는 가혹할 정도로 빼곡히 자갈이 들어 찬 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날을 기다린다” 고 망설임 없이 말한다.
이 낙관은 도저히 낙관이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온 힘을 다해 보존된 귀하고 순도 높은 낙관이다.
강나영이 이런 낙관을 나눠준 대가로 우리는 그가 비장애중심주의 세상에 돌려준 크립 타임의 ‘장벽'을 일종의 ‘놀이 기구'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만성 질환과 장애가 없는 몸—하지만 잘 들여다 보면 그런 몸은 어디에도 없다—에게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배리어프리' 진입로, 자갈밭과 같은 일상생활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장벽'으로 번역하는 강나영의
‘장애중심주의'는 물론 죄책감을 자극한다. ‘정상'은 ‘비정상'에 빚지고 있다. 정상성 규범은 크립 타임과 같은 유연한 시간을
타자화하고 낙인화하는 방식으로만 제 힘을 강화한다. 강나영의 장벽은 물론 우리에게 이런 당연하고도 ‘불편한' 사실을
일깨운다. 하지만 크립타임의 리듬과 규칙만 숙지한다면 장벽은 또한 자비롭게도 비장애인에게도 개방 가능한 놀이 기구로
변모할 수 있다. 크립 타임의 놀이 기구에서 우리는 세계를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보는 방법을 배운다. “남들과
다른 시간을 가지지만 우리들만의 룰을 만들고 우리들만의 시간을 만드는”,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던 새로운 세계 만들기
(world-making)의 방법. 이것이 강나영의 장벽-놀이 기구가 우리에게 나눠 주는 선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