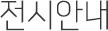금호미술관
마치 있는 것처럼_如在
- 전시기간 : 2025-11-13 ~ 2025-11-23
- 전시장소 : 3F
-
작가 :
송윤주
송윤주(b.1974)는 고대의 상형문자나 괘상(掛象)을 이용하여 ‘보이는 것'으로부터 그 핵심을 추출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기호를 창출하는 작업을 해 왔다. 그간 현대 생활세계에 존재하는 곳곳이나 현대인에게 존재하는 감정 중심의 면면을 다루어 왔다.
사람은 하늘과 땅과 조상의 기운이 응축되어 태어나고, 죽음을 맞이하면 다시 흩어져 돌아간다고 믿었다. 근본에 보답하기 위한 례(禮)가 필요하다. 환구단에서 하늘에게, 사직단에서 땅과 곡식에게, 종묘에서 조상에게 각 제(祭)를 올린다. 모호할 수밖에 없기에 명확한 개념 규정을 거부하고, 자세를 강조하는 방법으로 대응한 것이 우리의 선조들이었다. 그 핵심은 ‘마치 있는 것처럼'. 귀(鬼)와 신(神)을 대하여 제(祭)를 올릴 때의 마음 자세가 바로 “如在”이다.
하늘엔 북두칠성이 사람을 지켜보고, 땅엔 오곡이 자라서 뭇 생명의 먹이가 된다. 보이지 않는 바람은 태극전 위로 솟은 회화나무를 춤추게 하고, 고요한 궁궐 연못가의 버드나무를 흔들며 거북을 놀라게 한다. 허수가 뜨는 시절에 향을 피우고 술을 부어 귀신을 맞이하고, 자미원과 북두칠성을 향해 어린 송아지를 바쳐 하늘에 제사하고, 오곡을 거두어 땅을 숭배한다. 이는 다름 아닌 상(象)들의 향연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현대 생활세계에서 그들을 맞이하기 위한 공간은 있으나 잊히고 있는 ‘보이지 않은 것'을 표현하고자 시도하였다.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존재할 것이라고 신뢰하고 경외하는 죽음(死) 이후의 그 무엇, 귀(鬼)와 신(神)을 다룬다.
사람은 하늘과 땅과 조상의 기운이 응축되어 태어나고, 죽음을 맞이하면 다시 흩어져 돌아간다고 믿었다. 근본에 보답하기 위한 례(禮)가 필요하다. 환구단에서 하늘에게, 사직단에서 땅과 곡식에게, 종묘에서 조상에게 각 제(祭)를 올린다. 모호할 수밖에 없기에 명확한 개념 규정을 거부하고, 자세를 강조하는 방법으로 대응한 것이 우리의 선조들이었다. 그 핵심은 ‘마치 있는 것처럼'. 귀(鬼)와 신(神)을 대하여 제(祭)를 올릴 때의 마음 자세가 바로 “如在”이다.
제(祭)를 위한 마음 자세는 제사 장소인 제단과 건물을 규정하고, 나아가 제기의 모양과 제물을 결정하고, 재사의 시기와 시점은 별자리로 이어진다. 이는 모두 상(象)을 낳는다. 특별히 이번 전시에 등장하는 별자리는 삶이 끝나는 것에 위치하는 허수(虛宿)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