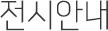금호미술관
우리의 밤은 너무 밝다
- 전시기간 : 2021-10-14 ~ 2021-10-24
- 전시장소 : 3F
-
작가 :
전은희
전은희 개인전
《우리의 밤은 너무 밝다 Our night is too bright》
2021. 10. 14 - 10. 24
세상이 검게 변하는 밤의 한가운데에 홀로 있을 때 생겨나는 두려움은 모두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다. 그래서 인류는 밤이 되면 인공의 빛을 찾아 곁에 두고 의지하기 시작했고 인공의 빛이 만들어진 이후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들의 공간을 환하게 밝히려 노력했다. 이것이 밤의 어둠이 주는 공포를 빛으로 차단하여 시각적인 안정감을 얻으려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 편리함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빛을 매개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길 원하게 되었다.
밤이 눈부시도록 빛난다는 것은 곧 ‘밤의 상실'을 의미한다. 흑단처럼 검어야 할 밤은 빛에 잠식당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또 익숙해지면서 많은 문제가 생겨나고 있으며 단순히 어둠의 공포를 제거하기 위한 빛의 역할이 여러 분야로 확장되면서 빛은 우리에게 또 다른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의 삶의 살갗에 닿아있는 필수 불가결하다고 여겨지는 것도 과하게 되면 느끼지 못하는 사이 주변부터 역습을 당하게 된다. 우리가 무언가를 과하게 욕심을 내면 반대급부의 문제점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마저도 무시하고 같은 노선을 유지한다면 더 큰 댓가를 치르게 된다. 여기서 밤은 우리의 삶을 균형을 유지 시키는 방식과 시간이며 너무 밝은 빛은 필요 이상의 욕심, 즉 탐욕을 상징한다. 욕심이 과해져 탐욕이라는 이기적인 감정들이 넘쳐나면 권력과 자본에 의해 우리의 기본적인 시간이 묶여버리고, 환경, 문화, 역사 등 모든 측면에서 개인의 일상과 정서가 파괴될 수도 있다. 휴식 같은 어둠이 쉴 시간을 빼앗기면 사람도, 동물도, 자연도 권리를 빼앗기고 일부는 원치 않는 고통 속에서 죽어가야만 한다.
작품에 나타난 소재들은 그러한 사건의 현장들이다. 갑자기 퍼붓듯 쏟아지는 피하지 못할 소나기나 숨쉬기조차 버거운 참을 수 없는 더위, 숲이 파괴된 평원에 몰아치는 먼지 바람은 파괴된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이며, 여전히 진행 중인 팬데믹도 그 경고의 일부다. 또 텅 빈 땅에 덩그러니 놓인 사물들이 상징하는 존재의 상실이나 파괴된 도시에 유령처럼 떠도는 사람들의 모습이 비단 그들만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그 검은 형상 속에서 우리의 얼굴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갑작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린 지금, 환경이 변하고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의 변화가 절실함에도 우리는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고통의 시간이 닥치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 빛을 쫓아가는 삶을 살 것이다.
나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빈 마음으로, 마음보다 더 비어있는 듯한 눈으로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는 걸 좋아한다. 그러나 빈 공간은 공간의 여유와 함께 형언하기 힘든 두려움을 갖고 있다. 매일 마주하는 화면들이 텅 비어있을 때도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흰 캔버스를 대면하고 있을 때는 가끔은 고통스럽기까지 하다고도 말하는 작가들도 있는데, 나의 경우는 흰색이 아닌 검은 화면에서 작업을 시작한다. 흰색 장지에 여러 차례 먹을 먹여서 검은 화면을 만드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검은 화면은 심리적으로 더 강한 공포를 준다. 그러나 두려운 가운데서도 화면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건 종이라는 물질의 불균질함이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형상들 때문이다. 그 형상들을 더듬어 슬쩍슬쩍 목탄으로 몇 번의 선을 긋다 보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검게 변한 내 손의 행위만 보게 되고 더욱더 집중하게 된다. 검은 화면이 주는 두려움은 어쩌면 검은 세계 안에서 새로움을 발견하고 창조할 원동력을 키울 수 있는 휴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휴식의 시간을 과도한 빛으로 무용지물을 만들어버린다면 우리는 다시금 인류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으로 회귀하게 될지도 모른다.
거부할 수 없는 역사와 자연현상들은 우리 몸의 액체처럼 돌고 돌아 순환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각자의 방식대로 삶을 노래한다. 자본에, 시간에, 권력에 자신들의 삶이 잠식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잘못된 역사는 반복되고 있음을 지각하지 못한 채 눈앞에 보이는 빛을 쫓아가기 바쁘다. 이번 전시는 대부분 현재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현장과 과거에 벌어진 사건의 현장들이 복합적으로 공존하는 화면과 우리가 일상에서 평범하게 겪고 있는 자연현상을 주제로 한 작업이다. 비와 같은 자연이 그려낸 그림, 바람이 해체해 버린 사물들, 그 안에 삶이 만든 리듬이 드러난 화면, 그리고 그 모두를 품고 있는 풍경을 통해 단순한 사건의 보고가 아닌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 현상처럼 되어버린 풍경을 마주하며,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말하고 공감하고 소통했으면 한다. 또 모든 물질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인간의 빛나는 탐욕을 감시하는 우리들의 눈에 긁힌 흠이 생기지 않도록 먼 곳을 응시하는 선명함을 타인들의 눈에서 발견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