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미술관
靑山流水_문봉선 초대전
- 전시기간 : 2010-04-02 ~ 2010-04-25
- 전시장소 : 2-3F
-
작가 :
문봉선
먹이 사람을 간다.
가끔씩 불어오는 해풍은 상큼했다.
지난 해 늦은 가을, 나는 고향으로 내려가 중학교시절 매일 아침저녁으로 걸어서 등교했던 옛 길을 따라 아이처럼 천천히 걸어보았다.
머리에 하얗게 눈을 덮어 쓴 11월의 한라산은 여전히 태고의 신비로움을 잃지 않고 있었다. 산중턱에 걸린 하얀 구름, 옹기종기 솟은 오름, 짙다 못해 검은 솔 숲, 현무암 돌담과 삼나무 방풍림, 이제 막 돌담어귀에서 싹이 트기 시작한 초록 수선, 태풍과 해풍이 다듬어 놓은 팽나무 고목, 그 위를 앉거나 날고 있는 검은 까마귀 떼, 잘 익은 황금빛 귤, 비양도 위로 펼쳐진 저녁 놀, 가없이 푸른 수평의 선, 한달음에 내달릴 수 있었던 3km 남짓한 중산간 언덕길은 옛 색조와 형태 그대로였다.
그러나 다정했던 옛 길은 이미 딱딱한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었고, 굽었던 길은 곧게 펴져 있었으며 이따금씩 지나가는 차들만이 세월의 흐름을 상기시켜 주었다.
나는 그 길가에서 비스듬히 자란 해송처럼 앉아 ‘畵道'의 먼 길을 찾아 방황했던 지난 시간들을 회상했다. 섬을 떠나 뭍에 올라 광야로 대륙으로 헤매고 내달렸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갔다. 묵향에 홀린 듯 먹과 인연했던 시간도 벌써 ‘지천명'을 넘기고 말았으니. 나는 이제야 ‘사람이 먹을 가는 것이 아니라 먹이 사람을 간다-非人磨墨, 墨磨人'고 했던 소동파蘇東坡의 말을 알 것도 같다.
『개자원화전芥子園畵傳』을 교과서마냥 외우고 또 외웠던 시간들, 그리고 또 그렸던 사군자들, 아!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 언저리에는 여태껏 그려왔던 화목들이 고스란히 살아 숨 쉬고 있었다. 그렇게 유년의 시절을 함께 한 언덕과 원색의 고향 풍광은 내 그림의 진정한 뿌리며 자양분이 되어 주었다. 내가 평소에 즐겨 사용하는 흑백의 강한 대비, 3원색, 검은 먹빛, 수평 구도 등은 이렇듯 무의식적으로 고향에서 체득한 것들이다. 아름다운 고향에서 자란 덕분에 남들이 고민하는 소재나 색감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다.
나는 어려서부터 지·필·묵을 가까이 한 이유로 자연스레 홀가분한 천연의 재료인 수묵화의 길을 선택했다. 수묵화는 예나 지금이나 전통과 현대라는 두 가지 지향점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둘 사이의 팽팽한 긴장은 지속될 것이다. 전통이라는 것은 결코 멍에가 아니다. 좋은 영양소를 듬뿍 가지고 있는 만큼 전통에 대한 깊은 애정이 동서양 회화에 대한 통찰과 어우러질 때 각자가 추구하는 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전통에 대한 혜안 없이는 현대로 나아갈 수 없고, 더더욱 현대 회화로서의 수묵화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일찍이 석도石濤가 ‘筆墨當隨時代'라 했듯 시대가 자연스럽게 그 시대의 회화를 낳는 것이다.
실로 표현의 재료가 더없이 다양해진 작금에, 누군가 내게 굳이 수묵만을 고집하는 이유를 묻는다면 ‘먹은 단순한 검은색 질료가 아닌 정신이자 역사라는 믿음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다. 먹은 3000년 역사를 관통하여 지금까지 이어져온 만큼 그 생명은 영원무궁할 것이다. 먹은 동양 회화의 시작이자 끝이다. 먹에서 시작해서 다양한 회화와 재료를 접한 후에는 진정한 먹의 가치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한 먹은 먹일 뿐이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기운생동'은 모든 화가들의 화두이자 목표이다. 이것은 동양 회화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모든 명화는 천지자연의 조화를 담고 있다. 기와 운의 조화가 적절할 때 생명 즉 생동감이 탄생하는 법이다. 그러나 기와 운의 경계는 지극히 크고 깊어서 도저히 말이나 글로써는 감당이 되지 않는다. 意在筆先, 骨法用筆, 胸中成竹, 法古創新 등의 화론에서도 배울 점이 많겠지만 늘 작가자신의 경험과 부단한 노력만이 예술과 회화의 근본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흔히 ‘당대'나 ‘현대'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그러나 품평의 세계에서는 결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 수묵화에서는 특히 진일보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은 화가들이 공감한다. 본인도 20~30대 왕성한 나이에 전통과 현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놓고 줄곧 줄다리기를 해왔다. 전통은 언제나 산처럼 높게 서 있었고, 현대라는 것은 낮은 데로 흐르는 물과 같은 것이었다. 누구나 접할 수 있고 접근이 용이하여 그 나라와 지역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흘러가겠지만 엄격한 보편성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간 북한산, 설악산, 지리산 등을 10여년 오르면서 현장 체험과 사생의 중요함을 십분 느꼈다. 또한 소재로써의 산이 갖는 현대 미술과의 거리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산을 내려와 자연스레 발걸음을 돌린 곳이 ‘섬진강 500리'였다. 물은 자칫 평범해 보이지만 산 못지않게 장소, 시간, 계절에 따라 다양한 표정을 가지고 있다. 이 무렵 잔잔한 수면위에 수직으로 늘어진 실버들 한 가닥을 통해 ‘靜中動'의 세계와 조우했다. 지극히 평범한 소재이지만 80년대 자전거 시리즈 다음으로 가장 많이 그린 소재다.
늘어진 수양버들에서는 동양적인 운치를 느낄 수 있다. 옛 그림에서도 버드나무는 소나무 다음으로 많이 그린 소재이다. 버드나무는 물가에 있을 때 아름답다. 곱고 여린 연두 빛은 맨 먼저 봄을 알리고, 가장 늦게 낙엽이 진다. 잎을 떨군 가지의 수직선이 찰랑대는 수면의 수평선과 어울려 묘한 긴장감을 만들어 냈다. 2000년 이후 줄곧 그려온 ‘流水-버드나무연작'은 내 작업 속에서 지극히 평범할 수 있는 소재를 몇 가닥의 묵선과 담묵을 이용하여 극도의 절제미와 단순미를 화면 밖으로 드러나게 한 작품들이다.
한 가닥의 선은 수 없는 관찰의 반복을 통해 표출된 나의 응축된 심상이며 자연에의 관조이다. 그것은 마치 채우려고만 했던 조급한 마음을 조금씩 비워내고 덜 그리고 다시 생략하는 중첩된 과정에서 찾은 강가의 둥근 돌맹이같은 단순미다. 비우려는 마음까지도 비운 작가 정신이 관객의 마음을 관통할 때 비로소 감히 소통의 세계를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작업하고 있는 ‘안개-霧' 연작도 ‘비움-虛'과 ‘운-韻'의 미학에서 출발했다. ‘霧-안개'는 ‘無-없다'와 발음이 같다는 것에서 ‘無法'과 ‘無形'의 의미도 부여했다.
근래 들어 나는 붓을 들어 일필휘지하는 순간보다 한지 앞에서 텅 빈 공간을 바라보는 시간의 축척을 더 소중하게 느끼곤 한다. 덜 긋고 덜 그리는, 단순이란 단어조차 초월하여, 비우고 또 비워서, 더 이상 비울 것이 없는 극점을 향해서, 오늘도 천천히 그리고 쉼 없이 먹을 간다.
나는 비록 먹을 갈고 있지만, 먹이 결국 나를 갈 것을 믿는다.
2010년. 봄. 문봉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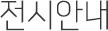

,143X366, 한지위에 수묵, 2009-1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