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미술관
최지영개인전
- 전시기간 : 2008-04-03 ~ 2008-04-27
- 전시장소 : B1
-
작가 :
최지영
금호미술관 지하1층
사물의 무대 - 매혹적 환영을 상연하는 최지영의 그림들 장면 1: 손을 뻗어 쑥 넣어도 그 끝에 다다를 것 같지 않은 깊은 어둠의 공간 속에 둥근 갓을 쓴 백열등들이 마치 꿀물이 흐르듯 달콤한 황갈색 빛을 흘리며 매달려있다. 어딘지 알 수 없고 어떤 상황인지 짐작할 수도 없는, 철저한 침묵 속에 있는 이 이미지는 어떤 연극의 한 장면처럼 우리의 감각 위로 떠오른다.
여기서 주인공은 램프이고, 그것이 연기하는 내용은 암흑 속에 둥실둥실 떠 있는 그 등빛을 포괄한 사물성이다. 이때 ‘사물성'은 단순히 전등과 같은 물건의 속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독일어 ‘Sachlichkeit'가 지시하듯이, 특정한 공간과 시간 속에서 독특한 물질성과 분위기가 드러나고 있는 총괄적 사태 그 자체를 이른다.
우리는 이렇게 사물이 스스로를 자족적으로 종합해서 표현하고 있는 이미지의 무대 앞에서 ‘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매혹 당'한다. 방금 내가 쓴 말에서 읽을 수 있듯이 능동형이 아니라 피동형으로, 관찰하는 이가 아니라 도취된 이로서.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최지영 그림의 힘이자 그 그림들이 강제하는 향유의 메커니즘이다.
이미지를 보면서 동시에 그 본 것을 언어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자연스러워하고 즐기는, 시각-인지 작용이다.(seeing is believing) 가령 당신은 어떤 그림을 보면서 ‘이건 A, 저건 B를 그린 것이고, 이렇게 해서 저런 걸 말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그래서 나름대로 이미지의 시각적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을 때, 그 작품에 쾌적함을 느낀다.
더하여 무엇인가 봤다는 만족감을 갖는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혹은 매우 드물게, 자기 지각의 범위 내에서는 논리적 이야기로 구성할 수 없거나 애초 그 자체에 언어적 내용이라 할 만한 것이 없는 이미지에 매혹 당한다.
가령 나는 영하 3도 정도의 서늘함이 느껴지는 왕가위의 어떤 영화들, 그 이미지 숏들의 현란한 연속운동을 보면서, ‘텅 빈 뇌의 벙어리' 상태로 기꺼이 대상에 끌려들어간다. 물론 그 순간순간에도 말의 파편들이, 조각난 상상적 언어 기호들이 뇌리와 혀 위로 떠다닐지 모르지만, 이미지에 매혹 당하는 순간 나는 내 신체가 오로지 ‘눈과 살갗'으로만 이루어진 것처럼 여겨진다.
누군가는, 내가 이 글의 서두에 문자로 묘사한 최지영의
한 그녀의 작품은 단지 사각형 평면 위에 그려진 하나의 정태적인 이미지일 뿐이어서 컷과 컷, 숏과 숏이 연속하며 운동을 만들어내는 영화의 이미지 흡인력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나는 대상(최지영 그림)의 단편적 사실이 아니라 대상의 특별한 강도(intensity)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최지영의 그림에서 그려진 사물의 이름을 파악하는 정도의 인지는 사고과정이라 말하기 어려우며, 영화냐 회화냐 하는 장르 구분도 별 의미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관건은 최지영의 그림에서 우리가 알아챌만한 모티브가 사실적으로 재현돼 있는가/그렇지 않은가에 있지 않다.
그와는 달리 그림 속 재현-내용이 우리를 추가적 사고로 이끄는가/감각이 매혹 당한 그 지점에 멈춰 세우는가 이다.
그 멈춰 세우는 힘은 어디서 나오며, 얼마나 강한가 이다. 장면 2: 생활 반경에 널려있어 가끔은 발길에 채이기도 하는 쿠션이나 베개가 과연 이렇게 우아한 몸을 하고 있었던가?
시시때때로 내 얼굴과 몸의 더러움을 받아내는 세면대가, 욕조가 정말로 이렇게 청아한 정결함과 고귀한 존재감을 풍긴단 말인가? 고딕식 촛대, 로코코풍 샹들리에는 원래 품격 있고 화려해서 그윽하거나 현란한 빛을 발할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 하나로도 진짜 이렇게 성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되고 유혹적인 상황이 빚어지는 것일까?
최지영의 그림이라는 무대에 등장하는 주인공-사물들은 이런 질문이 감상자의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흘러나올 만큼 아름답고 우아하며 정결한 동시에 신비롭게 스스로를 화면 위로 내세운다. 그 사물은 미술 형식으로 말하면, 두텁게 쌓아올리고 균질하게 펼쳐진 단색조의 풍요로운 유화물감 바탕 층에서 형상을 따라 물감을 지워나가는 기법을 통해 고유한 육체와 분위기를 얻은 환영(illusion)이다.
그러나 동시에 심리적으로 보면 이 사물들은, 이미지로 존재하면서 우리를 매혹시키고, 우리를 욕망케 하는 실재(the real)이다.
그림에 등장하는 물건들을 실제로 갖고 싶다거나 바로 이 그림을 소유하고 싶다는 의미의 욕망이 전혀 아니라 의식이 억압하고 있는 자아 상태를 벗어나 충동이 이끄는 쾌락 상태를 좇는 욕망. 그 무의식적이고 피동적인 심리 상태에 잠겨 있고자 하는 욕망이다.
그 지점에서는 그림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왜 그려졌으며, 어떤 이야기 혹은 어떤 생각을 우리에게 일깨우는가 하는 감상자의 의식적 질문은 잠재워진다.
다만 감상자의 눈은 다크 엄버 빛으로, 코발트블루 빛으로, 오렌지 빛으로 반짝이는 그림의 표면과 지워진 물감 층으로부터 떠오른 쿠션, 베개, 욕조, 샹들리에 따위의 사물 이미지를 더듬는 데 희열한다.
마치 우리의 손이 벨벳의 도도한 결을 쓰다듬을 때와 같이, 도자기의 서늘하고 매끄러운 표면 위를 미끄러질 때 그런 것처럼, 조명등의 따사롭고 깊은 빛 아래서 그러듯이, 최지영의 그림을 보는 우리 눈이 감촉하는 것이다.
이 감촉성, 그 감각적 매혹과 욕망의 충족이 최지영 그림이 무대 위에 올려 상연하는 사물의 실재이다. 이 이미지로서의 실재성이 우리를 ‘이것은 한갓 잘 그려진 그림일 뿐이야'라거나 ‘이 그림에는 아무런 개연성도 내러티브도 없어' 따위의 사고를 중지시키고, 그 인식 영역에서 자꾸 미끄러뜨리고, 환영의 향유에 만족하도록 한다.
보다 쉽게 말해서 최지영 그림의 힘은 이미지가 우리의 욕망하는 감각을 충족시키는 실재적 효과에서 나오는데, 그 힘이 감상자인 우리로 하여금 그림 앞에서 순간 ‘생각의 끈'을 놓도록 하는 정도의 강도로 향유 메커니즘을 작동시킨다는 것이다.
장면 밖에서: 최지영의 그림은 이 젊은 화가가 고심하며 매번 새롭게 그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게 다가선다. 정확히 대조하면 다르지만, 어디선가 본 듯하고 언제 어떤 상황에선가 경험했던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이다. 예컨대 내게는 최지영의 그림 중, 화면 오른쪽 구석에 늘어뜨려진 커튼이 전부인
또 누군가는 최지영의
이런 정도로 최지영 그림의 모티브는 특별할 것이 없고, 그 그림이 자아내는 분위기는 우리 감성의 클리쉐(cliche)를 자극한다.
그런데 나는 바로 이 점들이 최지영 작업의 힘이라 생각한다. 앞서도 썼듯이 우리가 사고를 멈추고 기꺼이 이미지의 환영적 향유에 만족하는 것은 그만큼 그 이미지가 우리의 감성에 어필하면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상투형 그림과 우리의 상투형 감수성을 자극하는 그림은 분명히 다른데, 최지영의 그림은 기민하게도 이 후자의 차원에서 작동하는 것이다. 둔감해진 우리 상투형 감각의 상태를, 핀셋으로 집어내듯이 현실로부터 추출해 캔버스 평면 위에 들이대 놓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동시에 최지영 그림의 클리쉐적 효과와 감상자의 감각에 어필하는 힘이, 앞으로 이 작가가 작업을 해나가는 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험상, 우리 감수성에 깊이 박혀있는 상투형을 추출하고 분석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더군다나 그것을 종합하고 객관화하여 또 다른 작품으로 구현하는 과정은 자칫하면 그 작품 자체가 클리쉐의 변주가 될 수도 있다.
또, 감상자의 감각적 향유는 휘발되기 쉬운 인상의 일회적 예술 수용과 등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매혹적이고 좀 더 표현적인 이미지로 언제든 대체될 수 있다. 그런 예술 수용은 언제든 이전에 향유한 작품의 의미를 무가치한 것으로 내팽개친다.
이런 맥락에서 내게는 최지영 그림의 현재적 상태가, 그 이미지의 힘이 위태롭고 한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나는 이 글에서 최지영의 그림을 ‘사물의 무대'로 논했지만, 사실 우리 인간에게 사물은 삶의 범주 속에서 펼쳐진다.
그러니 이 작가의 그림들이 사물을 무대화하고 있다는 나의 말은 이면에 그녀의 작업이 삶으로부터, 현실 생활로부터 유리돼 있다는 판단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읽어야 한다. 즉 그녀의 그림은 우리의 때 끼고 구차한 일상과 절연하고 있으며, 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사태와 생각과 경험을 다소 많이 미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절연, 그러한 미화가 어느 면에서는 예술, 특히 그림이 가진 이미지의 효용성이기는 하다. 하지만 작가는 자기 미술에서 환영의 작동이 멈추는 순간, 가상이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 지대를 예상해야하지 않을까?
연극무대에 필히 불이 꺼지는 순간이 찾아듦을 아는 것과 같이, 영화관 바깥에서 감각만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세계가 이어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강 수 미 (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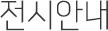
Bathtub,162x130cm,oil on cavas,2006.jpg)
Blue Bathtub,150x150cm,oil on canvas,2007.jpg)
orange chandelier,100x100cm,oil on canvas,2007.jpg)
Bathtub,162 x130 cm,Oil on canvas,2007 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