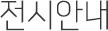금호미술관
김태호 초대전
- 전시기간 : 2006-05-25 ~ 2006-06-11
- 전시장소 : 1F
-
작가 :
김태호
금호미술관 1,2,3층
2006년 5월 금호미술관에서 갖는 <개와 늑대 사이의 시간>이라는 전시 역시 그러한 주제의 연관이라고 보인다. ‘개와 늑대 사이의 시간'이라는 이 흥미로운 제목은 개와 늑대가 구분되지 않는 어두움이 깔리는 저녁 무렵, 그러니까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의 어둑어둑한 황혼을 의미하는 프랑스 식 표현이다. 이 시간은 밝음에서 어두움으로 넘어가는 불분명한 시간일 뿐 아니라 이승과 저승의 과도적인 시간이며, 현실과 이상, 또는 환상의 세계의 불분명한 시간으로, 하나의 형태가 다른 형태로 변화하는 몰핑 (morphing), 또는 트랜스(trans)의 개념을 가진다. 이 시기는 한편 50대에 들어와 60대를 바라보는 김태호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는 이제까지의 자신을 돌아보며,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으면서, 늘 익숙한 것들에서 느끼는 낯설음, 일탈과 변신을 꿈꾸면서도 현실의 세계로 돌아올 수 밖에 없는 나른하면서도 슬픈, 공간과 시간을 표현한다.
개와 늑대가 구분되지 않는 시간은 카멜레온의 형태들로 나타나기도 한다.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고 불명확한 카멜레온은 어쩌면 자기 자신을 필요할 때 마다 바꾸는 현대인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래서 슬프기도 하다. 또 그의 작품에서는 눈물인지 구름인지 혹은 나무인지 애매하고 구별이 되지 않는 형태들도 보이기도 한다. 초기의 조심스러운 시도들은 이제 확신을 가진 것 같고, 점점 대작이 되어가고 있으며, 괘도에 오른 것 같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의 작품에서는 인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필자가 본 작품중에 인물이 등장하는 것은 자신의 뒤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일종의 초상화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뒤 모습의 자화상은 초상화는 닮아야 한다는 기본 전제를 뒤집어 버렸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인물이 없어도 인물의 존재를 느끼게 하는 작품들도 있다. 예를 들어 2006년도에 제작한 대형 작품에서는 곡선의 장식적인 의자 하나가 덩그라니 놓여있고 의자 뒤에는 약간 적은 그림자 같은 형태가 있다. 반 고흐가 그린 자신과 고갱의 의자는 거의 두 화가의 초상화라고 할 수 있듯이 이 의자도 주인의 부재를 시사한다.
그러고 보면 김태호는 직설법을 사용하지 않는 작가다. 그는 분명하고, 확실한 것보다는 불확실하고, 경계가 애매하며, 신비스러우며, 보이지 않지만 보이고, 들리지 않지만 들리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 그의 그림의 의미는 금방 알기 어렵지만 그는 어쩌면 바로 이러한 반응을 그의 그림을 보는 우리에게서 기대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 김영나 글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