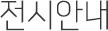금호미술관
서성원 개인전
- 전시기간 : 2005-10-06 ~ 2005-10-16
- 전시장소 : 1F~3F
-
작가 :
서성원
< 금호미술관 2층>
서성원의 사진 “시간을 보다/looking at time”에 대하여
글: 정주하, 사진가, 백제예술대학 사진과 교수
1.
저 멀리 바다가 보인다. 새벽빛에 푸르름이 더해져 짙은 녹색를 띠는 아련한 바다. 바다 앞쪽으로 드문드문 야트막한 섬도 보이나, 실상은 그 바다 위로 치솟는 태양의 궤적이 보다 강렬하게 내 가슴을 훑고 지나간다. 적막은 계속되고, 붉게 시작한 빛의 행보는 금방 투명한 색으로 변해 창공에 긴 선을 긋는다. 주변은 검거나, 푸른색이어서 곡선의 빛이 도드라져 나오기 매우 적합하다. 그리고, 그 적막을 가르는 빛의 선은 그러나 어느 지점에서 뚝하고 멈춘다. 그 끝이 조금 되 말려 둥글기는 하지만 이는 태양의 모습이 가지는 일부분에 의한 것일 뿐이고 빛은 그렇게 멈춘다. 그만이다.
창공 어느 지점에서 멈춘 그 선의 끝은 내 의식의 끝이기도 하고, 내 시선의 끝이기도 하다. 무엇으로도 보상 받을 길 없는 나의 애오로운 눈길은 그 선의 끝에서 멈추어 어쩔 줄 모르고 서성이고 있다. 내가 멈추고, 네가 멈추고, 산이 멈추고, 바다가 멈출 수는 있어도 빛이 멈추고, 태양이 멈추는 일은 없는 법. 이는 시간이 멈추고 존재가 멈춘 것을 의미한다. 죽음을 세우는 다른 방식이다. 내 의식을 실은 시선은 그 시간의 죽음에 저항한다. 내 시선이 그 빛의 멈춤으로부터 더 먼 우주로 나아가려 애쓰는 동안 지구가 돌며 태양으로 나아간다. 이 멈춤에서 시작한 기이한 진행은 나를 다시금 혼란스럽게 하나 이는 나의 착각일 뿐. 내 앞의 사진에선 ‘멈춤'이 흔들림 없이 멈추어 있다.
2.
사진을 해 오면서 태도를 중시해 온 지 한참이 됐다. 어쩌면 낯설게 들릴 이 태도론은, 사진에 요구되는 모든 행위를 작업태도와 관찰태도로 구분하자는 것이다. 즉 , 작업 안에서 필요한 형식적인 측면과 그 촬영된 대상에 대한 작가의 관점과 해석을 동시에 생각하고 파악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습관적으로 형식과 내용으로 작품을 파악하거나, 이해하려는 입장들에 대한 작은 ‘대항'인데, 단지 내용과 형식으로 대상을 바라볼 경우 작업의 생산자인 작가가 그 작업 안에 존재할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작품이란 이미 작가의 손을 떠나면 감상자의 것임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작가의 길을 지향하는 사람들이나, 작품을 보다 작가적인 입장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경우 단지 작품을 그 형식과 내용으로만 구분하여 이해하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단순한 감상자라 하더라도 어찌 작품을 작가의 태도와 떼어내고 이해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 또한 이러한 생각을 공고하게 했다.
그동안 내게 ‘왜 사진을 하느냐' 물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모두 나의 삶의 행보를 따스한 마음으로 걱정하며 물었던 것이며, 나는 어릴 적 그 가슴에 어렴풋하게 스며드는 질문 앞에서 고통스러워하곤 했다. 내가 나를 몰랐고, 또 내가 무엇인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매체의 속성과 본질에 대한 파악이 전혀 되지 않던 당시에 느끼는 것은 오직 두려움뿐이었다. 그리고, 사진이라는 매체의 힘을 알게 되고, 나 또한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그와 같은 질문에 스스로 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 후 “나는 사진을 통해 내가 보는 세계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어지는 것”으로부터 행복함을 느낀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내 생산물의 결과가 가져다주는 행복감보다 그 생산물의 생산 과정에서 얻게 되는 고통이 더 나를 행복하게 한다고 믿게 된 것이다. 위에서 잠시 태도를 언급한 것은 바로 이러한 나의 작가로서의 입장이 나 뿐만이 아니라 다른 작가들에게도 유효하리라 생각해서이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서성원이라는 작가의 작업을 나는 이 태도론적 입장에서 파악한다. 그는 줄곧 긴 시간 동안을 이 한 가지 주제에 매달려왔다. 뭐 특별한 사진학습을 한 것도 아니요, 멋들어진 학위를 소유한 사람도 아니다. 오로지 자신이 믿는 사진의 환희와 그 환희를 따라 만들어지는 순간의 고통에 맞서고자하는 의지가 전부인 작가이다.
그의 사진에서 주장함이 없다거나, 특별한 인문학적인 냄새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함은, 그가 주장함이 없거나 인문적인 학습이 부족해서가아니다.
외려 그것보다 더 먼저, 텐트와 촬영 장비를 짊어지고 산속에 올라가 몇 날이고 그 절대 공간 안에서 자신과 싸우며 하루에 한 커트씩 촬영했던 그 순간에 대한 애정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그것 밖에는 드러낼 것이 없다고 강변하며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작가의 작업태도인 것이다.
대상이 움직이는 것이며, 절대적인 것이며, 파악되지 않는 커다란 것이기에 그는 그 대상을 움직이도록 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작아지려 카메라의 시선을 외면하였고, 그것을 파악하지 않고 그대로 용납하려 애썼던 것이다. 이것은 그의 관찰태도이다.
그는 빛을 이기려한 것이 아니라, 그저 프레임 안에서 용납하려했을 뿐이다. 그 긴 시간동안.
3.
니세포르 니옙스는 1827년에 인류 최초로 사진을 만든다. 오랫동안 연구하고 실패하기를 거듭하다가 드디어 역청으로 알려진 비투먼 가루를 라벤다 기름에 녹여 동판에 입힌 후 이를 카메라 옵스큐라에 넣어 자그만치 8시간의 노출을 주어 만든 것이다.
이 작업은 자신이 살고 있던 살롱-쉬르-손 지방의 생 루 드 바렌느 마을에서 이루어졌다. 자신의 집 2층에 있던 연구실 창문너머로 보이는 바깥 편 건물의 지붕을 찍은 것이다. 지붕에 반사된 밝은 색이 희미하게 보이고, 그 밑의 벽들은 검게 처리가 됐다. 긴 시간 노출을 줌으로 인해 빛의 이동이 생기고 그에 의해 그림자가 함께 이동한 때문이다.
헌데 궁금한 것이 있다. 그것은 이 노출을 주었던 8시간 동안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하는 것이다. 분명 짧지 않은 시간이었으니 아무 생각 없이 앉아만 있었을 수도, 그렇다고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공간을 떠날 수도 없었으리라. 그 고통스러운 긴 시간동안 니옙스가 했음직한 행동은 병상의 형을 생각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전부였을지도 모른다. 상상일 뿐이다.
그가 견디어낸 긴 시간동안, 빛은 비투먼이 발린 그 동판을 좌에서 우로 옮아 다니며 인간을 위해 처음으로 잠상(潛像)을 완성한다. 내게도 서성원에게도 그리고 세계의 모든 사진가들에게도 의미가 있을 그 혁명이 이루어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서성원의 사진을 보면, 그 때 니옙스가 아픈 형의 몫까지 노력해 완성했던 그 일을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 한 인간이 참으로 고독한 시간을 견디면서 해낸 작업의 가치를 어떻게 계산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마치 시간에 걸터앉은 듯 그 긴 시간을 견디면서 만들어 낸 이 사진들은 단지 오랫동안의 기다림이 고통스러웠겠다는 위무의 마음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는 시간에 대한 물음과,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각고의 노력과, 그 모두가 마련해 펼쳐 보여주는 아름다움이 깊은 감동을 주는 것이다.
4.
서성원의 사진 안에는 시간이 들어있다.
사진의 문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시간성이다. 사진에 사용되는 시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노출을 통해 만들어지는 시간성이 그것이다. 짧고 긴 노출시간으로 인하여 사물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 준다. 시간이 짧은 경우는 순간이 정지하고, 시간이 긴 경우에는 순간이 이동한다. 흐트러진 순간의 모습으로는 감정이 번지는 것을, 순간이 고착된 모습으로는 명료한 인식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사진의 특성을 서성원은 매우 잘 사용하고 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고장의 특색인 바다와 그 바다를 비추는 빛을, 자신이 가진 가장 풍요한 자산인 시간으로 덧씌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백만 배를 더 주어야 노출이 정상이 되는 필터는 그에게 시간을 벌어주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기존의 빛의 빛깔은 파괴가 되고 새로운 색으로 거듭났다. 그의 사진에 보이는 저 불명료하면서도 독특한 색의 경계는 이렇게 탄생한 것이다. 물론 그 중앙을 가르는 태양과 별과 달의 궤적은 한결같이 투명하다. 모든 파장의 색을 다 머금은 탓이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그 촬영되는 대상이 가지는 시간성이다. 인간의 모습을 고착한 사진은 그 인간을 영원히 그 시간대로 묶어 두기도하고, 지속시키기도 한다. 이것이 사진이 정지시킨 시간의 양면성이다. 하여, 롤랑 바르트가 사진을 일컬어 죽음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간의 단면 안에 갇힌 대상의 시간성을 따지는 것이 어불성설일 수 있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볼 때 사진이란 대상의 전면에 반사되어진 빛 알갱이의 총량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지는 사진과 지금 서성원의 사진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의 사진에서 절반이 넘는 공간은 대상의 반사 빛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뿜는 빛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해와 달과 별의 궤적이 그것이다. 그는 그 빛들과 직접 대면을 한 것이다.
이제 서성원의 작업은 그 빛을 타고 어디론지 흘러갈 것이다. 또 다른 대상으로의 전이가 될지 혹은 또 다른 빛의 줄기를 찾아 나설지 나로서는 알 길이 없다. 다만 그가 빚어내는 저 긴 호흡의 작업들이 그 숨결을 잃지 않고 지속되기를 빌어볼 따름이다.